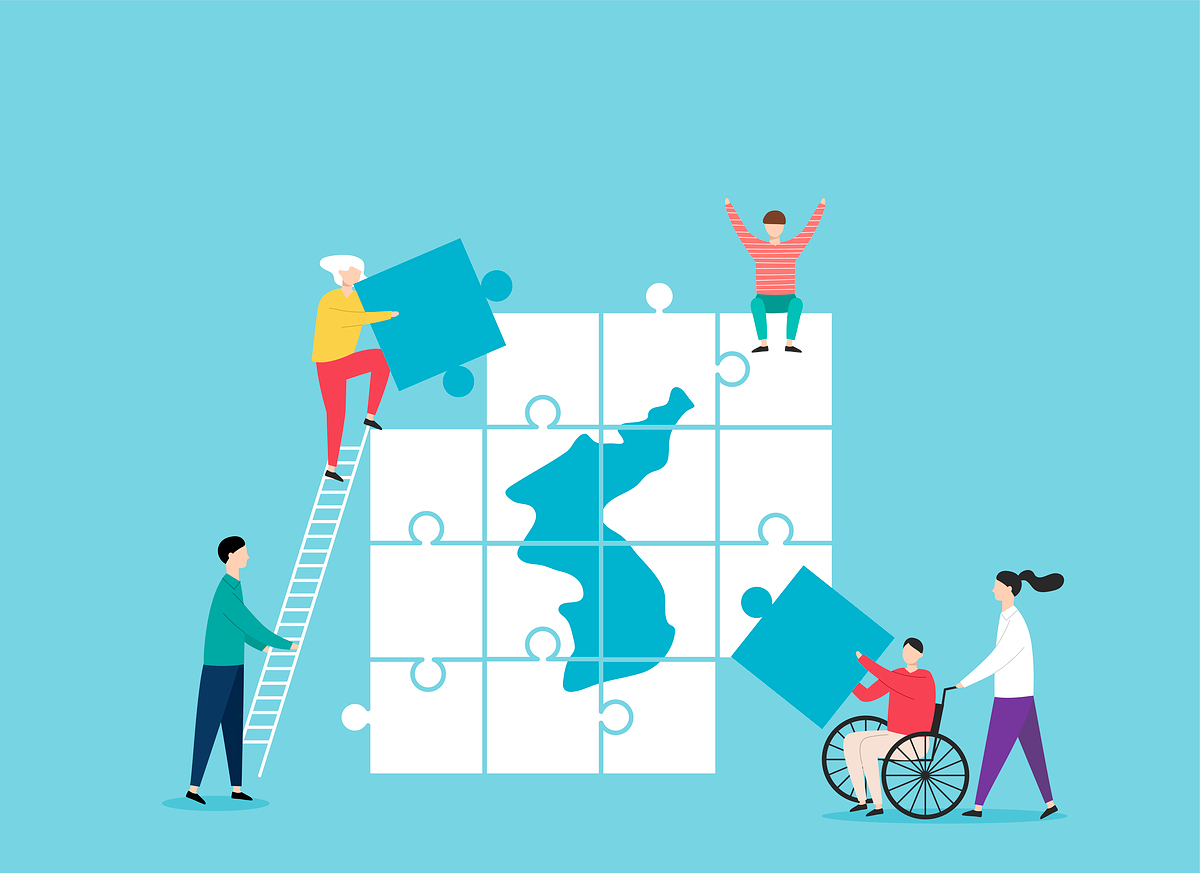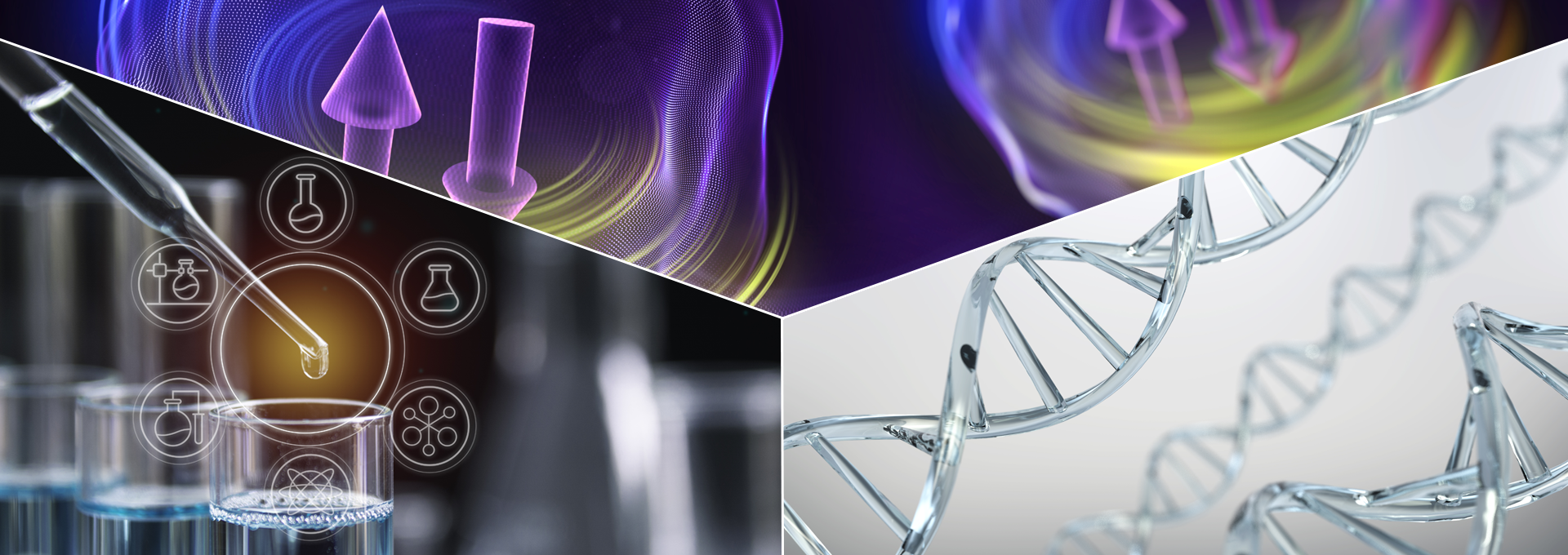프런티어과학학부 커뮤니티
아주대학교 프런티어과학학부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
2025.0923
[학부] 2025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수강철회) 안내(09/24~09/26)
-
2025.0911
(*기간연장)[학부] 2025학년도 2학기 수업피드백 실시 안내(09.22.(월)~10.19.(일))
-
2025.0825
[학부] 2025-2학기 수강정정 안내(09.01(월)~09.05(금))
★ 첨부파일은 아래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본교 공지사항] 2025-2학기 수강정정 안내 바로가기(클릭) 수강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여석 관련 1) 개강일 전날(08.29(금) 오후)에 휴학생의 수강신청 정보가 일괄 삭제될 예정이니, 08.31(일) 저녁 7시~11시에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여석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2) 개강일이후 매일 휴학(일반,군, 질병 등)하는 학생의 수강신청 삭제를 당일 수강정정 마감시간인 오후 4시 이후에 처리하여 추가여석을 일부 확보하며, 추가여석은 수강정정 기간 중 매일 저녁 19시~23시까지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2025학년도 2학기 개강일은 09.01(월)이며 2025년 2학기 과목별 운영방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5-2학기 과목별 수업운영방식(수업시간, 수업방법 등) 안내 바로가기 ★ 수강신청한 과목의 주차별 수업운영은 아주Bb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니 수시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수강정정 기간 중에는 정원이 마감된 과목의 취소로 인한 잔여석에 대해 수강신청 취소 신청지연제도가 운영이 되며,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수강신청 매뉴얼)을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정정 기간 중 매일 오전 8시 30분~오후 3시까지는 수강신청 취소 신청지연제도가 운영됩니다.) # 출석 관련 안내 바로가기 # 아주 Bb 관련 문의 [교수학습개발센터] 아주Bb 이용 안내(학생용) 바로가기 - 각 과목별 수업 운영방법은 강좌별 아주Bb 공지사항으로 개별 안내되므로 아주Bb를 상시 확인해주십시오. - 수강신청한 과목에 대하여 강좌별 아주Bb 게시물 확인이 가능하며, 수강신청한 후 학생별 아주Bb에 과목 추가는 수강정정 후 10~15분 뒤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수강정정 기간(09.01~09.05) 중에, 수강신청 정보를 삭제하면 기존 아주Bb 관련정보(과제물 제출, 관련 활동 등)도 함께 삭제되므로 수강정정 시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 학적변동 처리 - 08.29(금) 업무 시간 중에 학적 변동 처리가 진행되며, 휴학생의 수강신청 정보는 개강일 전에 자동 삭제 처리됩니다. (* 휴학생 중 복학신청자는 재학생으로 변경, 재학생 중 휴학신청자는 휴학생으로 변경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중 2025-2학기 수강신청을 하고 08.22(금)~08.28(목)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정보도 개강일 전에 자동 삭제 처리됩니다. # 공과대학 학생 상담 관련 공과대학 재학생의 경우 수강신청 마지막날(전체 학생), 수강정정 기간에는 상담여부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 수강정정을 위한 최종 수강신청 대상자 생성은 08.29(금) 오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2025.0923
- NEWS
더보기
-
2026.0112
유성주 교수, 값비싼 백금 활용↑그린수소 '극한의 촉매기술' 개발
- 그린수소 생산 활용 '백금' 촉매 1g으로 82g 효과 - 소재의 물리적 한계 예측 및 제어 통해 수소 생산 시스템의 효율·내구성 동시 확보 아주대학교 화학과 유성주 교수팀이 청정 에너지원인 그린수소의 생산에 활용되는 ‘백금(Pt) 촉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에 수소 생산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더욱 효율적인 공정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화학과 유성주 교수는 수소 생산 촉매의 성능을 결정하는 백금(Pt) 원자를 서로 뭉치지 않는 단일원자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기술을 개발, 소재 효율을 이론적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태양광 수소 생산을 위한 원자 분산 백금 촉매의 안정성 임계값(Stability Thresholds of Atomically Dispersed Platinum Catalysts for Solar Hydrogen Production)’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앙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에 12월17일 게재됐다. 우리 학교 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의 박준서 석박사통합과정생(위 사진 오른쪽)이 제1저자로 참여했고, 유성주 교수(화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위 사진 왼쪽)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그린수소(green hydrogen)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분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만들어내는 청정 수소를 말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로 그린수소가 주목받고 있으나, 수전해 및 광촉매 기반의 수소 생산 시스템에서는 고가의 ‘백금(Pt) 촉매’가 주로 사용되며 이는 수소 생산 전체의 비용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값비싼 백금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백금 입자를 나노미터(nm) 수준에서 원자(atom) 단위로 줄여 표면적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입자가 작아질수록 표면 에너지가 높아져 흩어져 있던 원자들이 불안정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서로 뭉치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수소 생산 성능의 저하를 불러온다. 이에 아주대 연구팀은 실제 환경에서 백금 원자들이 서로 뭉치지 않고 최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구조적 임계점을 찾아냈다. 이를 통해 백금 원자가 뭉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정에 투입된 모든 백금이 100% 반응 표면에 노출되는 활용법을 실현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단 1g의 백금으로 기존 나노입자 82g에 해당하는 수소 생산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촉매의 질량당 활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최소한의 백금을 사용함으로써 수소 생산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팀은 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복접한 공정 없이 비교적 간단한 합성으로 촉매를 제조할 수 있고, 장시간의 구동 실험에서도 성능의 저하 없이 안정적인 수소 생산 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유성주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는 촉매의 성능 저하 원인을 원자 수준에서 이해,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인 해결 전략을 제시한 것”이라며 “고가 귀금속의 활용도를 극대화함으로써 여러 친환경 에너지 공정의 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우수신진, G-램프사업, 자율운영 중점연구소지원사업, 그리고 고등기술연구원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단일원자 백금(Pt) 입자의 전자현미경 사진. 화살표로 표시된 밝은 대비점들은 지지체 표면에 하나씩 고르게 분산된 백금(Pt) 원자들을 나타내며, 백금이 뭉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분산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촉매의 질량당 활성이 향상되어, 백금을 최소한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수소 생산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
2025.1218
물리 오상원 교수, 과기정통부 대형 양자기술 프로젝트 참여
- 7년 동안 총 117억 연구비 지원 아주대학교 물리학과 오상원 교수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형 연구개발사업인 ‘2025년도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양자통신·센서)’에 참여한다. 앞으로 7년여 동안 총 117억원 상당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양자통신·센서)’는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의 핵심 분야인 양자센서(Quantum Sensing)와 양자통신(Quantum Communication) 분야에서의 선도국 수준 기술 도약 및 상용 기술 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양자 센서와 양자통신 기술은 앞으로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과 의료 분야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자 센서는 기존 기술로는 어려웠던 국방·우주 탐사, 지진 등 자연재해 예측, 질병 징후 조기 감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양자 통신 기술을 활용하면 금융 거래를 비롯한 정보 전송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도청이 불가능한 양자 암호 통신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학교 물리학과 오상원 교수(위 사진)가 사업 주관을 맡아 성균관대·숭실대·세종대·부산대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다. 공동 연구팀이 진행할 프로젝트 주제는 <얽힌 고체 점결함 큐비트를 활용한 표준양자한계 극복 양자센싱연구>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32년까지 7년 3개월, 정부 지원 연구비는 117억원 상당이다. 공동 연구팀은 표준양자한계를 뛰어넘는 초고민감도 양자센싱 구현을 목표로 센싱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센서로는 측정이 어려운 단일 분자·스핀 수준의 미세한 자기장, 전기장, 온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정밀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러한 기술은 ▲차세대 바이오 이미징 ▲뇌신경 활동 관측 ▲반도체 결함 분석 등 첨단 산업과 의료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
2025.1112
아주대∙UNIST, 차세대 반도체 소자 적용 기대 ‘엑시톤’ 상호작용 향상 기술 개발
아주대∙UNIST 연구팀이 이황화텅스텐(WS₂) 나노닷(Nanodot)을 이용해 반도체 내부의 준입자인 ‘엑시톤’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엑시톤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어 최근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WS₂ 나노점을 이용한 엑시톤 상호작용 증가 연구(Laterally Confined Monolayer WS₂ Nanodot for Enhanced Excitonic Interaction)’라는 제목으로 나노 분야 글로벌 저널 <나노 레터스(Nano Letters)> 10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해당 연구는 아주대학교 물리학과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연구진의 공동연구로 수행됐다. 아주대 에너지시스템학과 임승재 연구원과 UNIST 신소재공학과 여정인 연구원이 공동 제1저자로 참여했고, 아주대 물리학과 이재웅 교수와 UNIST 신소재공학과 서준기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로 연구를 이끌었다. ‘엑시톤’이란 반도체 내부에서 전자와 정공(hole)이 결합해 형성되는 준입자(quasiparticle)로, 반도체의 전기적·광학적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이러한 준입자들이 나노미터 수준의 좁은 공간에 갇혀 있을 때 나타나는 양자 상태의 변화를 ‘양자 구속효과’라고 한다. 특히 두께가 1nm 이하인 2차원 반도체에서는 엑시톤이 이차원 평면 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양자 구속효과로 인한 엑시톤 간 상호작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이에 준입자가 여러 개 결합한 다체 준입자(many-body quasiparticle)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슈퍼 컴퓨터 보다 월등히 빠른 양자 컴퓨터나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 암호 통신 등 새로운 양자 기술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공동 연구팀은 빛이나 전자빔을 사용하는 기존 나노점 합성법과 달리, ‘다공성 박막 기반 합성법’을 개발해 높은 결정성을 가진 이황화텅스텐(WS₂) 이차원 나노점 제작에 성공했다. 새로 개발된 나노점은 두께가 1nm 이하에 크기는 수십 nm로, 기존 이차원 소재가 갖고 있는 수직 방향의 양자 구속효과 뿐만 아니라, 수평 방향의 움직임을 제한해 추가적인 양자 구속효과를 유도함으로써 엑시톤 밀도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연구팀은 기존 이차원 시료에서는 관측이 매우 어려웠던 엑시톤 2개가 결합된 바이엑시톤 상태를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이황화텅스텐(WS₂) 나노점 구조에서 발생하는 빛의 밸리 분극(valley polarization) 특성도 향상되어, 밸리트로닉스(valleytronics) 기반 양자정보 소자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재웅 아주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엑시톤’의 특성을 제어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양자정보 소자의 설계에 활용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 양자광학 연구와 차세대 반도체 소자 개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교육부의 G-LAMP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초연구실지원사업,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양자정보 인적기반 조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이차원 WS2 나노닷의 모식도 및 엑시톤에 의한 발광 신호를 보여주는 이미지 * 위 사진 - 이재웅 교수팀의 연구 모습
-
2026.0112